“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라고 한다. 한번도 시선을 준 적 없지만 언제나 그 곳에 있던 세계가 갑자기 인식되며 선악과를 삼킨 이브마냥 스스로의 허물을 갑자기 깨닫고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 있다. 때로는 책을 읽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런 치명상을 입는다. 아무런 악의 없이, 단지 늘 그래왔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이 실은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에 반한다는 것을 알아 버린다. 이미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 저자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찾아 몸부림치지만 내 얄팍한 사고의 헛점을 조목조목 파고드는 책 앞에 결국 항복한다. 앎으로써 상처입은 독자는 더이상 책을 읽기 전과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 상처를 회복하며 다른 사람 -바라건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Jonathan Safran Foer의 <We Are the Weather (우리가 날씨다)>는 내게 상처를 주는 책이었다. 책을 읽는 동안 스스로의 습관을 변호하려던 의식적, 무의식적인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책이 지적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표지에 적힌 “이 책은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며 당신과 음식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것이다”는 평에 고개를 끄덕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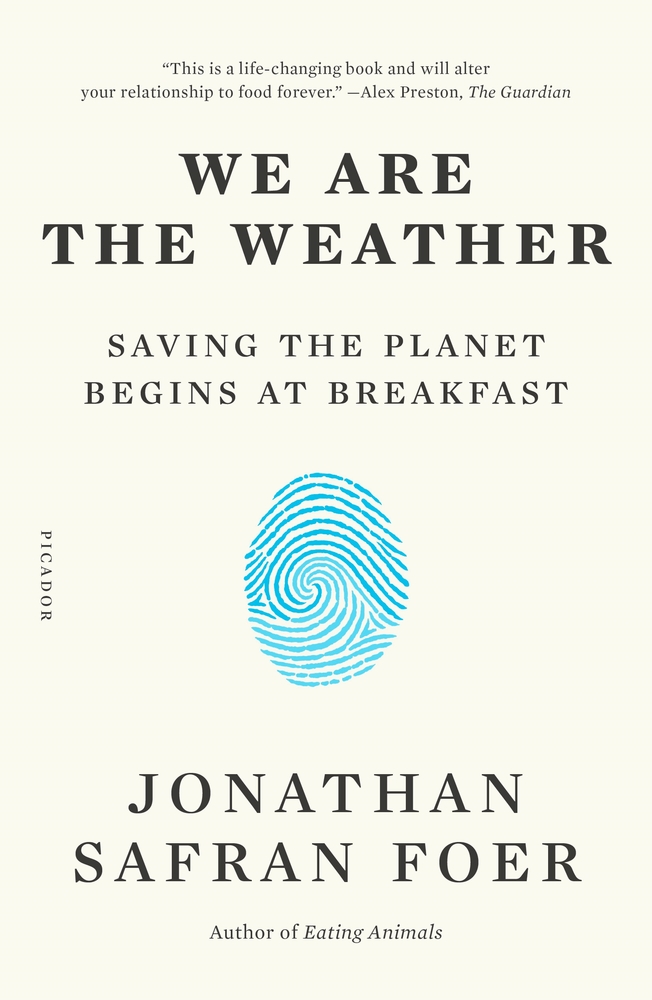
이 책은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해 개개인이 실천할 것을 호소하는 책이다. 저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별한다. 단순히 정보를 접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상처받고) 나아가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믿는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심각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 부유한 국가의 생활수준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지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오래 전에 넘어섰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기후 변화를 줄이려면 개인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무슨 실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막연했다. 가령,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전기자동차를 타고 나무를 많이 심는 일들이 도움이 된다고 믿는 정도였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활동들이 단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기분을 낼 뿐이라고 한다. 물론 아무 실천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보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실천만은 정작 외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는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실천이 무엇인지 몰랐고 당연히 실천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나 자신이 습관적으로 기후 변화를 가속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무엇이 중요한 실천인지조차 여지껏 몰랐다는 점이 부끄러웠다. 기후 변화가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
If we accept a factual reality (that we are destroying the planet), but are unable to believe it, we are no better than those who deny the existence of human-caused climate change.
p. 23
그 실천이란 육식을 줄이는 것이다. 축산업이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추정치에 차이가 나지만, 축산업을 위해 불태운 삼림이 흡수하지 못하는 탄소의 양까지 감안하면 51 %까지 추정되기도 한다. 저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나 기업 규제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식습관을 바꾸는 실천 없이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대규모 축산업이 환경에 부정적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책을 읽기 전에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큰 줄은 몰랐다. 단지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기를 즐기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겼다. 사람에겐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며 합리화했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이 몸에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입의 즐거움을 위해 그 이상 먹는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라는 말이 유행하던 것을 기억한다. 얼마나 재미있는 말인가.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고기를 먹으며 스스로를 토닥이는 문화를 향유하는 일원으로서 웃었다. 하지만 책을 읽은 후엔 이 농담이 더이상 재미있지만은 않았다.
Changing how we eat will not be enough, on its own, to save the planet, but we cannot save the planet without changing how we eat.
p. 87
책에서 주로 비판하는 미국인들의 (어마어마한) 육식 습관에 비하면 나는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라며 슬며시 변명해보기도 했다. 스스로가 기후변화 가속에 한 몫 하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상처받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면죄부를 주고 싶었나보다. 그러나 곧 미국인들을 탓하며 나의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거대 기업들을 탓하며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들과 나는 본질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상태인 것을 알았다. 나 역시 필요 이상의 고기를 먹고 있다는 그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내가 지구에서 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중요하지도 않은 사실은 내 행동을 바꾸지 않을 핑계일 뿐이다. 육식이 기후변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핑계를 댈 틈이 없다. 내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 초조해지며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만큼의 실천이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고서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실천으로 보는 저자의 관점이 오롯이 이해되었다. 아는 데서 그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숙연히 상처입고 스스로 변화하며 회복해 가거나, 선택은 독자의 몫이다. 나는 후자의 사람이 되고 싶다. 단지 식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이 지구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실천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은가.
Post script
하루에 육류 섭취를 한 끼로 제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실천이라고 생각했다. 원래부터 매 끼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막상 의식적으로 육식을 제한하려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나름의 노력과 적응이 필요한 일이었다. 처음 이틀 정도는 배가 고팠다. 별 생각 없이 육류를 넣어 먹곤 했던 점심에서 그 부분을 단순히 제하고 식사를 했더니 포만감이 현저히 줄어든 느낌이었다. 보상심리로 저녁엔 오히려 고기를 더 찾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다. 식사에 육류가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 신경쓰게 되었고, 전에는 관심 없이 지나치던 비건 식단들을 유심히 보게 됐다. 한 주가 지나자 냉장고에는 채소가 많아지고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반찬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두 주가 지날 무렵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생각보다 빠른 변화에 스스로도 놀랐다. 나는 여전히 고기를 먹지만, 확실히 전보다 적게 먹거니와 무엇보다 내 식사가 날씨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며 먹는다.